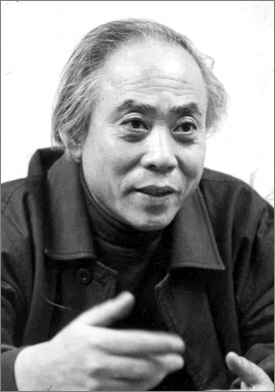|
비목(碑木) - 그 숨은 이야기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머어언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울어지친 비목이여 그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물론 소대장에 계급은 소위렸다. 그렇다면 영락없이 나같은 20대 한창 나이의 초급장교로 산화한 것이다. 일체가 뜬 구름이요, 일체가 무상이다. 가사의 생경성과 그 사춘기적 무드의 치기가 부끄러워서 "한일무"라는 가명을 썼었는데 여기 一無라는 이름은 바로 이때 응결된 심상이었다. 젊은 비애를 앓아가던 어느날, 초가을의 따스한 석양이 산록의 빠알간 단풍의 물결에 부서지고 찌르르르 산간의 정적이 고막에 환청을 일으키던 어느 한적한 해질녘, 나는 어느 잡초 우거진 산모퉁이를 돌아 양지바른 산모퉁이를 지나며 문득 흙에 깔린 돌무더기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푸르칙칙한 이끼로 세월의 녹이 쌓이고 팻말인 듯 나딩구는 썩은 나무등걸 등으로 보아 그것은 결코 예사로운 돌들이 아니었다.
뜨거운 전우애가 감싸준 무명용사의 유택이었음에 틀림없다. 어쩌면 그 카빈총의 주인공, 자랑스런 육군 소위의 계급장이 번쩍이던 그 꿈많던 젊은 장교의 마지막 증언장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그시절의 비장했던 정감이 이쯤 설명되고 보면 비목 같은 간단한 노래가사 하나쯤은 절로 엮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감성적 개연성을 십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순수하고 티없는 정서의 소유자였다면 누구나가 그같은 가사 하나쯤은 절로 빚어내고 절로 읊어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 그때 그곳의 숨김 없는 정황이었다. 
2년 가까이 정들었던 그 능선 그 계곡에서 나를 밀어내고 속절없이 도회적인 세속에 부평초처럼 표류하게 했지만 나의 뇌리, 나의 정서의 텃밭에는 늘 그곳의 정감, 그곳의 환영이 걷힐 날이 없었다. 우리 가곡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쏟던 의분의 시절, 그때 나는 방송일로 자주 만나는 작곡가 장일남으로부터 신작가곡을 위한 가사 몇편을 의뢰받았다.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내 머리속에 스치고간 영상이 다름아닌 그 첩첩산골의 이끼 덮인 돌무덤과 그 옆을 지켜섰던 새하얀 산목련이었다. 그 깊은 계곡 양지녘의 이름모를 돌무덤을 포연에 산화한 무명용사로, 그리고 비바람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무덤가를 지켜주고 있는 그 새하얀 산목련을 주인공따라 순절한 연인으로 상정하고 사실적인 어휘들을 문맥대로 엮어갔다. 당시의 단편적인 정감들을 내 본연의 감수성으로 꿰어보는 작업이기에 아주 수월하게 엮어갔다.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모를 이름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울어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널리 회자되기게 이르렀다. 유독 그곳 격전지에 널리 자생하여 고적한 무덤가를 지켜주던 그 소복한 연인 산목련의 사연은 잊혀진 채 용사의 무덤을 그려본 비목만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한 셈이며 지금도 꾸준히 불려지고 있다. 
가사의 첫 단어인 "초연"은 화약연기를 뜻하는 초연(硝煙)인데, "초연하다" 즉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오불관언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없는 말이고 해서 패목(牌木)의 잘못일 것이라는 어느 국어학자의 토막글도 있었고, 비목을 노래하던 원로급 소프라노가 "궁노루산"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한 일이 있었다. 비무장지대 인근은 그야말로 날짐승, 길짐승의 낙원이다. 한번은 대원들과 함께 순찰길에서 궁노루 즉, 사향노루를 한마리 잡아왔다. 정말 향기가 대단하여 새끼 염소만한 궁노루 한마리를 잡았는데 온통 내무반 전체가 향기로 진동을 했다. 그날부터 홀로 남은 짝인 암놈이 매일 밤을 울어대는 것이었다. 덩치나 좀 큰 짐승이 울면 또 모르되 이것은 꼭 발바리 애완용 같은 가녀로운 체구에 목멘 듯 캥캥거리며 그토록 애타게 울어대니 정말 며칠 밤을 그 잔인했던 살상의 회한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복한 내 누님 같은 새하얀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면 그놈도 울고 나도 울고 온 산천이 오열했다. "궁노루 산울림 달빛타고 흐르는 밤"이란 가사의 뒤안길에는 이같은 단장의 비감이 서려 있는 것이다. 
비목의 물결로 여울질 것이다. 휴가나와 명동을 걸어보며 눈물짓던 그 턱없는 순수함을 모르는 영악한 이웃, 숱한 젊음의 희생 위에 호사를 누리면서 순전히 자기탓으로 돌려대는 한심스런 이웃 양반, 이들의 입장에서는 비목을 부르지 말아다오. 소신마저 못펴보는 무기력한 인텔리겐차, 말로만 정의, 양심, 법을 되뇌이는 가증스런 말팔이꾼들, 더더욱 그같은 입장에서는 비목을 부르지 말아다오. 
이름 없는 비목의 서러움을 모르는 사람, 차라리 산화한 낭군의 무덤가에 외로운 망부석이 된 백목련의 통한을 외면 하는 사람, 아직도 전장의 폐허 속에서 젊음을 불사른 한 많은 백골들이 긴 밤을 오열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가련한 사람, 혈육의 정을 모르는 비정한 사람, 착하디 착한 이웃들을 사복처럼 학대하는 모질디 모진 사람, 순연한 청춘들의 부토 위에 살면서도 아직껏 호국의 영령앞에 민주요, 정의요, 평화의 깃발 한번 바쳐보지 못한 저주받을 못난 이웃들이여, 포연에 휩싸여간 젊은 영령들이 진노하기 전에! 비목의 작가 한명희는 1939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서울대음대를 졸업하고 ROTC 2기로 임관하여 6.25전투가 치열했든 강원도 화천에서 GP소대장으로 군복무, 20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997년 ~ 1999년 제11대 국악원장 1985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2006년9월 별세 |
'비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처 나누지 못한 말 (0) | 2019.06.08 |
|---|---|
| 현충일날 울려 퍼지는 진혼곡의 유래 (0) | 2019.06.08 |
| 누군가를 부를 숨결이 남아있다면 (0) | 2019.05.26 |
| 시집가는 딸에게 (0) | 2019.05.25 |
| 인연 (0) | 2019.05.11 |

 40년 전 막사 주변의 빈터에 호박이나 야채를 심을 양으로 조금만 삽질을 하면 여기 저기서 뼈가 나오고 해골이 나왔으며 땔감을 위해서 톱질을 하면 간간히 톱날이 망가지며 파편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순찰 삼아 돌아보는 계곡이며 능선에는 썩어빠진 화이버며 탄띠 조각이며 녹슬은 철모 등이 나딩굴고 있었다. 실로 몇개 사단의 하고 많은 젊음이 죽어갔다는 기막힌 전투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한 셈이었다. 그후 어느날 나는 그 격전의 능선에서 개머리판은 거의 썩어가고 총열만 생생한 카빈총 한 자루를 주어왔다. 그러고는 깨끗이 손질하여 옆에 두곤 곧잘 그 주인공에 대해 가없는 공상을 이어가기도 했다.
40년 전 막사 주변의 빈터에 호박이나 야채를 심을 양으로 조금만 삽질을 하면 여기 저기서 뼈가 나오고 해골이 나왔으며 땔감을 위해서 톱질을 하면 간간히 톱날이 망가지며 파편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순찰 삼아 돌아보는 계곡이며 능선에는 썩어빠진 화이버며 탄띠 조각이며 녹슬은 철모 등이 나딩굴고 있었다. 실로 몇개 사단의 하고 많은 젊음이 죽어갔다는 기막힌 전투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한 셈이었다. 그후 어느날 나는 그 격전의 능선에서 개머리판은 거의 썩어가고 총열만 생생한 카빈총 한 자루를 주어왔다. 그러고는 깨끗이 손질하여 옆에 두곤 곧잘 그 주인공에 대해 가없는 공상을 이어가기도 했다.